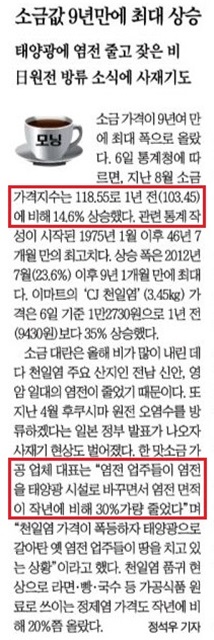 |
▲ 조선일보 9월7일 B1면. |
조선일보가 지난 7일 경제섹션 1면에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소금값 9년만에 최대 상승’이란 기사를 썼다. 잦은 비와 염전 축소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발표에 사재기 현상까지 겹쳐 소금 가격지수가 1년 전보다 14.6%나 올랐다는 거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 ‘태양광에 염전 줄고 잦은 비’라는 작은 제목을 달아 염전 밭이 최근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에 자리를 내준 측면을 지적했다. 소금값 상승마저 태양광 발전 때문이라는 식이다.
염전업자들이 염전을 포기하는 이유가 과연 태양광 발전 때문일까.
염전 산업의 하락세는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천일염 가격은 2011년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하락했다. 20kg 한 포대의 산지 천일염 가격은 2014년 5600원에서 2015년 4300원, 2016년 3200원, 2017년 2540원까지 떨어졌다. 2019년엔 1800원까지 떨어져, 원가에도 미치지 못했다. 즉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가 났다.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지역 생산자들은 2019년 7월 천일염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밀려드는 값싼 수입산 천일염 때문이었다. 유통 기업의 농간에 당해 낼 재간이 없었다.
결국 수지를 맞추지 못한 염전업자들은 태양광에 자리를 내줬다. 값싼 수입 천일염이 국산 천일염을 밀어냈는데도, 조선일보는 태양광 발전이 소금 농사를 밀어냈다는 투다.
염전에서 곧바로 태양광발전소로 바뀐 것도 아니다. 처음엔 폐염전을 새우양식장으로 활용했는데 요즘 들어 태양광으로 바뀌었다. 이는 철저하게 수익 논리다.
이렇게 전국 염전 면적은 2010년 103㎢에서 지난해 87㎢로 약 15.4% 감소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한 맛소금 가공업체 사장의 말을 빌려 “염전 업주들이 염전을 태양광 시설로 바꾸면서 염전 면적이 작년에 비해 30%가량 줄었다”고 했다. 그동안의 추이를 살펴볼 때 이는 부정확한 보도다. 뻔히 염전 면적 통계가 있는데도, 맛소금 가공업체 사장의 발언을 받아 적었다. 굳이 정부 통계를 언급하기 싫었다면 좀 더 정확한 염전업자에게 물어야 할 걸, 가공업자에게 물어 내용을 부풀렸다.
10년 동안 줄어든 염전 면적만큼 천일염 생산량도 급격히 줄었는데도, 국산 천일염 가격은 함께 곤두박질 쳤다. 왜 수요-공급 법칙에 반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유통기업이 마구 들여오는 수입 소금 탓이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마치 태양광이 염전을 뺏는 바람에 소금 가격이 치솟았다는 식으로 보도한다.
이미 2019년 염전을 없애지 않고 염전과 태양광 발전이 동시에 가능한 연구 실험이 성공했다. 이는 ‘염전 병행 태양광 발전의 실증과 시뮬레이션’이란 제목의 논문으로도 발표됐다. 실험 결과 바닥에 태양광 패널을 깐 염전에서 바닷물이 패널 위 2cm 높이를 유지할 때 해수에 의한 광 손실보다 냉각 효과에 의한 모듈 성능의 증가가 전체 발전량에 더 크게 기여했다. 연간 발전량을 비교했을 때 ‘염전 병행 태양광’은 육상 태양광과 유사한 연간 총 발전량을 보여줬다.
조선일보 같은 친원전주의자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행하려면 태양광 설비가 400기가와트에 달해야 하는데, 이는 서울시 10배 면전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한다며 비꼰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은 날로 기술혁신을 이루어 2030년이면 서울시 3.2배 면적만 있어도 400기가와트 발전이 가능하다.
 |
▲ 조선일보 9월6일 1면(위)과 2면. |
조선일보는 지난 6일 1면과 2면에 원전건설을 중단한 기업이 값싼 전기(원전)를 못 쓰게 된 주민들에게 245억 원을 보상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미국 검찰이 원전건설을 중단한 것을 중대범죄로 보고 4년여 간 강도 높게 해당 기업을 수사해왔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2013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원전 건설을 시작했다가 2019년 초로 예정된 준공을 앞두고 2017년 건설을 중도에 포기했다. 조선일보는 “미국 연방검찰이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건립 무산으로 피해 입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에너지 지원에 245억 원을 보상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우선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부터 알아보자. 1886년 창업자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피츠버그에 세운 전기회사로 출발해 방위산업체로 입지를 다졌고, 튼튼한 가전제품도 생산했던 미국 명문기업이었다. 그러나 과거의 명성은 온데간데없이 몰락해 지금은 원전만 겨우 운영한다. 2006년 일본 도시바가 인수했지만, 경영은 여전히 엉망이었다.
우리나라와 인연도 깊다. 웨스팅하우스 계열사 유니온스위치&시그널은 서울지하철 3, 4, 5, 6, 7, 8호선과 분당선에 신호기를 시공했고, 고리 원전 1호기도 이 회사 기술력으로 지어졌다. 현대그룹과 손잡고 현대엘리베이터도 만들었다.
1940년대 방산업과 백색가전에도 진출해 각광을 받았다. 아폴로 11호가 달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도 웨스팅하우스가 제작한 30 프레임짜리 카메라로 촬영됐다. 잘 나가던 웨스팅하우스는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장난감 등으로 마구잡이로 확장하다가 휘청거렸다.
1979년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미국에서 약 30년가량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되자 웨스팅하우스는 결정타를 입었다. 2006년 도시바가 54억 달러 헐값에 인수했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멜트다운 된 원자로 3개 가운데 2개가 도시바의 제품이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탈원전으로 방향을 틀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미국에선 원전 안전 기준이 강화돼 경영위기가 더욱 심화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2018년 캐나다 자산운용사에 되 팔렸다.
조선일보 보도에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양이 의원은 “웨스팅하우스 원전건설 사기 사건의 본질은 ‘원전건설 손실을 은폐하고 계속 원전건설을 한 것이 중대범죄’라는 점”이라고 했다. 양이 의원은 조선일보 보도처럼 “원전 건립 무산으로 저소득층이 저렴한 전기료 등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기사 내용은 미국 연방 검찰의 공소장을 비롯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안전기준 강화로 공기를 맞출 수 없어 약 7조 원(약 61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원전건설을 계속했다. 그 결과 이를 알지 못한 투자자들이 추가 투자하도록 유도해 피해를 전가했고, 이 피해를 결국 전기요금에 전가해 저소득층까지 피해를 입혔다. 양이 의원은 “원전건설 지연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 2009~2016년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선 9차례나 전기요금이 인상됐다”며 “만약 2022년까지 공사를 계속했더라면 웨스팅하우스 손실은 더욱 늘어나, 회사와 소비자 모두 더 큰 부담을 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래서 조선일보 기사는 꼭 뒤집어 읽어야 한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