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스레 내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들과 기억이 있다. 나의 불행, 힘듦, 슬픈 사연을 토해내길 바라는 사람들 속에서 무던히 힘겨움을 얘기하면서도 어디론가 숨고 싶었다.
피해자라는 굴레를 씌어 놓고 찾아오는 그들을 보며,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 불행이 한 차례 기사로 실린 후 잊힐 이야기가 될 생각을 하면 마음이 답답했다.
그럼에도 나 역시 그들을 만났던 것은 나의 절박함을 한 번이라도 더 들어달라는 이기적인 이유였다.
누군가는 수전 손택의 <타인의 고통>을 들고 왔고, 누군가는 기자 명함을 들고 왔으며, 누군가는 그저 내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찾아왔다고 했었다.
희정 작가는 그 당시 나를 찾아온 사람 중 한 명으로, 그는 손에 핸드폰만 들고 왔다. 오랜 대화는 몸에 무리가 간다고 말하니 미안해하며 다음에 또 오겠다며 허겁지겁 가던 이였다. 실제로 얼마 뒤 귤 한 봉지를 가지고 어설프게 웃으며 찾아온 사람. 이미 9년 전 일이다.
 |
나의 언어가 쏟아져 나올 때
그 사람이 자신의 인터뷰 경험을 책으로 냈다. 《두 번째 글쓰기》(희정, 오월의봄, 2021.10.18)다.
“자신의 언어가 쏟아져 나올 때 또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때다. 그때가 되면 자신을 열어 기록자를 받아들인다. 실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게다.” (73쪽)
이 문장을 보며 처음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려 했었던 이유가 다시 생각이 났고,
“개의치 않는 태도가 몸에 밴 사람이었다. 의연함이 만들어지기까지 쌓인 시간을 떠올렸다. 흘려보내지 못하고 몸으로 겪어냈을 시간.” (81쪽)
잊고 싶지만 내 몸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 공감했다. 나에겐 잊고 싶은 기억인 나의 이 ‘흔한’ 이야기가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고민은 이 문장과 만났다.
“당사자가 줄 수 있는 공감의 언어가 있다. 몸으로 겪어낸 언어. 이 언어는 비슷한 처지를 겪는 이들에게 새로운 통로를 마련해준다.” (97쪽)
이 책을 보며, 말하고자 했던 나의 시도가 부질없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다. 이 책은 나의 이름이, 나의 이야기가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삶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그렇기에 누군가에겐 내 삶의 이야기가 필요할 수 있다고. 숨고자 했던 내게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 준 마음들이 있었다. 그 마음들이 모인 책이다.
인터뷰이와 기록자, 우리의 일
인터뷰이와 기록자는 서로의 생각을 들을 기회가 없다. 그들이 나(인터뷰이)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며 나는 어떻게 비춰질까. 왜 이런 재미없는 이야기를 들으려 하는 것일까. 인터뷰에 응하며 이런 것들에 대해 한참을 고민한 적이 있었다.
희정 작가는 책에서 그 답을 해주었다. “오늘이 제일 재미있어!”라던 청소 노동자의 말을 듣고 “청소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가는 것을 보며, 눈물도 흘리고 재미있다고도 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듣고 싶어졌다고.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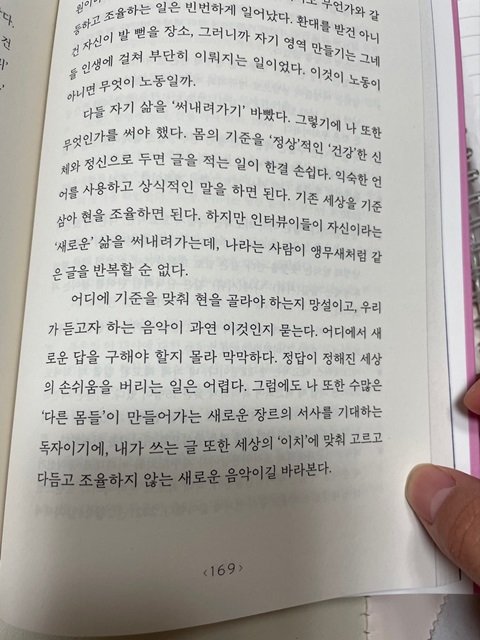 |
“저 사람들은 눈물만 흘리는 사람들이 아닌데. 눈물에도 전략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인데. 심지어 눈물 정도는 스스로 알아서 잘 닦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 꾸역꾸역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썼다.” (179쪽)
‘나’의 일로만 생각한 일을 ‘우리’의 일로 같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란 사실을 이 책을 보며 늦게나마 알고 위안 받았다. 그의 말처럼 목소리는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니. “기록(노동)은 외로울지언정 함께하는 작업”(77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