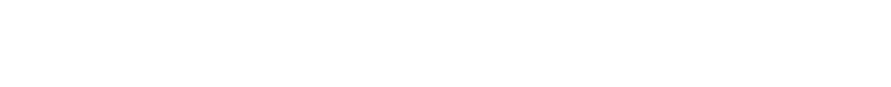[사진/ 정운]
박다솔 기자
국내 주요 기업 면접 기출 문제에는 ‘노조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있다. 지원자도, 기출 문제를 푸는 취업 준비생들도 그 질문의 숨은 의도를 안다. ‘노조를 들 것이냐, 말 것이냐’, ‘노조를 든다고 답하면 나는 너를 꽤 불편하게 바라보겠다’는 것. 어렵사리 직장을 잡아도 늘 눈칫밥을 먹는다. 회사가 불편해하는 ‘노동조합’과 처음으로 조우한 날. 왠지 이곳에 가입하면 회사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다. 처음 맞닥뜨린 노조는 신입 사원에게 어색함, 막막함, 그리고 회사에 대한 배신이 아닐까 하는 죄책감마저 안겨 준다. 그런 신입 사원들이 노조를 알아 가는 과정은 꽤 복잡다단하다. ‘참세상 이야기’의 첫 화는, 노동조합이란 이질적인 문명과 맞닥뜨린 신입 사원들의 이야기다.
노동조합, 가입해? 말아?
국내 굴지의 대기업 H 사에 입사한 J 씨. 회사에는 교섭력과 조직력이 막강한 노조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 노조 가입 여부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노조에 가입됐다. 처음엔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며 ‘이질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2년 차가 된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그는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걸 알게 됐다”고 고백했다. 회사를 상대로 한 노조의 교섭력이 높아져야 임금, 노동 시간 등을 비롯한 노동 조건 전반이 개선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도 노조에 대한 말 못 할 고민이 있었다. 향후 과장 이상으로 진급하기 위해선 노조를 탈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조 탈퇴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해 보고 싶은 마음이 큰 탓에 언젠가는 노조를 탈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자신을 뽑아 준 회사에 대한 고마움이 남달라 노조를 불편해하는 신입도 있다. 은행에 입사한 L 씨는 “회사가 있어야 직원도 있다”며 노조의 활동을 못마땅해했다. 그는 노조 활동이 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 만큼 회사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고 윗분들도 잘 챙겨 줘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어서 “회사를 어렵게 하는 노조 활동이라면 탈퇴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K 사 신입 기자 D 씨는 복수노조가 있는 곳에 입사해 여러모로 불편하다. 이른바 ‘어용 노조’는 없지만, 갈등이 심했던 것이 사실. “소속된 노조가 다르면 평상시 일할 때도 벽 같은 게 느껴진다”는 게 D 씨의 솔직한 심정이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양쪽 노조가 사측과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본인에게 가입을 권유한 한 노조에 가입했고 지금은 그 노조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회사의 위기 상황을 알게 됐는데, 노조 위원장이 노조원들에게 협상 내용을 가감 없이 얘기해 줬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지도 되고요.”
마지막까지 잡아 주는 울타리
노조 없는 회사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IT 기업 N 사에 다니는 프로그램 개발자 C 씨는 잦은 야근과 주말 재택근무에 절어 있다. 업계의 변화 속도가 워낙 빨라 뒤처질까 항상 걱정이다. 철저히 실적으로 평가받고 연봉 협상을 진행하는데 이런 경쟁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조금만 뒤처져도 회사에서 밀려난다는 생각에 야근과 주말 근무를 불평할 마음의 여유도 없다. 고용 형태도 불안하다. 실제로 IT 노동자들의 특수고용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프로젝트를 만들어 프리랜서 개발자들을 고용하고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흩어지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AS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생긴다. 2011년 농협 전산망 사태도 이와 관련이 있다. 나경훈 IT노조 사무국장은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니까 끊임없이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재교육 비용을 기업이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C 씨에게 노조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노조가 있었다면 업무 강도가 이렇게 세지는 않았겠죠”라는 답이 돌아왔다.
노조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만 노조는 노동자들의 마지막 보루다. 지난해 말, 신입 사원까지 희망퇴직 명단에 올려 공분을 샀던 두산인프라코어의 사례가 그렇다. 같은 해 11월, 두산인프라코어는 현장 기술직 직원들을 쥐어짜 결국 40명의 희망퇴직 명단을 완성했다. 하지만 그중 21명은 퇴사를 거부했고 회사는 이들에게 대기 발령을 내렸다. 사실상 ‘희망퇴직’을 앞세운 정리해고였다.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싸웠고, 퇴사를 거부한 21명은 결국 회사로 돌아왔다. 한쪽에선 사무직 700여 명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떠났다. 사무직 중심의 노조는 2013년 이미 없어져 희망퇴직 대상 직원들은 회사와 개별 협상해야 했다. 21명의 퇴직을 막은 것은 금속노조 산하의 두산인프라코어지회다. 2011년 기업 노조가 생기며 신규 가입자는 줄고, 탈퇴자는 늘었지만 이번 일로 노조의 힘을 다시 한 번 알렸다. 손원영 두산인프라코어지회장은 “비록 소규모 사업장이지만 지부와 금속노조가 있고 노조 내에 법률원이 있어 유기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초 정부는 ‘쉬운 해고’로 대표되는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 쉽게 쫓겨날 수 있게 됐다. 재작년 미생이 나왔고, 작년엔 송곳이 있었다. 올해는 미생이 만드는 송곳이 필요할 때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