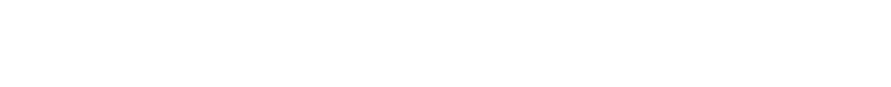양지혜
청소년 활동가로 살다가 스무 살을 맞았다. 청년초록네트워크, 청년좌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민지 – 은지, 2014 (사진)
페친 A 씨의 사생활
어느 날,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넘겨 보다 페친 A 씨를 엿보게 되었다. A 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나와 페이스북 친구가 된 사람으로, 잘 알지는 못하나 일상적으로 게시 글을 공유하는 사이다. 프로필에 종종 자녀 사진을 올려놓을 만큼 가족적인 사람이기도 하다.
그가 올린 게시 글은 “딸이 어느새 다 컸다”는 말로 시작했다. 어렸을 때는 아무 말 않더니, 요즘은 엉덩이를 만질 때마다 신체 자기 결정권 침해라며 화를 낸다는 내용이었다. 그런 딸의 모습이 귀여워서 그는 딸에게 똥침을 놓았고 딸은 그 자리에서 울어 버렸다고 했다. 그의 페이스북 친구들은 ‘보기 좋은 가족의 주말 풍경’이라며 웃음 지었고, ‘역시 가정적인 아버지네요’라고 A 씨를 추켜세웠다.
그는 가끔 여성주의적인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여성주의는 호의가 아니라 투쟁으로 이루어진다나 뭐라나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나는 그가 집회에 나가서 팔뚝질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뜨거운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집에 돌아가서는 최루액으로 흠뻑 젖은 운동화를 벗을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그 무렵, 나는 친구에게 상담을 해 주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사촌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그녀는 남성의 신체 접촉을 불편해했다.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는 스물이 다 된 그녀에게 서슴없이 뽀뽀를 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가족은 무슨, 그놈의 좆같은 스킨쉽’이라고 중얼거렸지만, 해 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보기 좋은 가족의 주말 풍경’에 우리는 없었다.
집 밖에선 진보, 집안에선 꼰대
언젠가 ‘보기 좋은 가족의 주말 풍경’을 거부하고 탈가정한 청소년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어디서 노조 위원장을 지낸 사람이라고 했다. 내게 전화를 걸어 사십 분간 자신이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며, 얼마나 진보적인 부모인지를 늘어놓았다. 실제로 그의 요구는 매우 명료했다. “지금 미성년자이니 학생의 본분을 다하라. 다시 ‘가족의 주말 풍경’으로 돌아와라.”
실제로 상황은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었다. 탈가정은 2주를 채 넘지 못했고, 그는 주말 풍경 속으로 쓸쓸히 걸어 들어갔다.
꼰대란 누구인가? ‘나이도 어린 것들이 어디서 설치냐’는 둥 직접 청소년을 혐오하는 이들은 고차원적인 꼰대는 아닐지도 모른다(그는 그저 천박한 누구일 뿐이다. 권위주의자이자 나이주의자인 그들은 차라리 평범한 대중에 가깝다).
정말 특출한 꼰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풍경이 되기를 강요한다. 그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격이라는 것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풍경이 옳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이들은 대체로 스스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며, 누군가를 자신의 풍경으로 억지로 끌어들이는 일을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소위 ‘진보’라고 불리는 이들이 더 고차원적인 꼰대가 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집 밖에서 진보라 불리는 이들이, 집안에서는 꼰대가 된다. ‘사생활’이라고 불리는 진보 활동가의 집안은 스스로의 질서에 맞지 않는 것들을 재단한다. 때때로 잘리는 것은 인격이고, 존엄이다. 배제에 맞서 싸우는 ‘진보’가, 스스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 공간에선 너무도 쉽게 누군가를 배제한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꼰대다
나는 청소년 활동가로 1년 남짓을 보내다가 올해 비청소년이 되었다. 비청소년인 지금, 나는 나 스스로가 나이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느낀다. 남성이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여성이 가질 수 없는 성별 권력을 가지듯, 나 역시 나이가 들면서 ‘나이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나이주의에 대한 감수성이 강한 청소년 활동가 진영에서는 덜하지만, 나이주의라는 개념조차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 대중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운동에 오래 몸담고 운영을 도맡게 되면서, 운동체 안에서의 발언권도 강해졌다. 이곳은 나의 집안이 된 것이다.
꼰대를 비판하면서 썼던 페이스북 게시 글에 “너도 꼰대야”라는 댓글이 달린 적이 있다. 나는 그 댓글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댓글을 단 사람은 내 오랜 친구였다. 그는 하루에 열 시간 남짓 일하면서도 손님이 없을 때는 불로 소득으로 월급을 받는 것 같아 싫다고 했다. 나는 아주 강하게 옳지 못한 생각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이야기였다. 나의 세계에 존재하는 옳음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했다. 그 순간, 나는 그에게 꼰대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 내가 공동체 안에서 하는 고민은 이것이다. 내가 가진 권력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그것은 폭력이 된다는 것. 집안에서 안락함이 아닌 불편함을 찾아야 한다는 것. 내게 보기 좋은 풍경이 타인에게도 그렇지는 않다는 것.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꼰대다. 진보 활동가인 당신의 ‘집안’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