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전히 한 번의 클릭을 위해 선정적인 제목을 뽑은 것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써 놓고 보니 사실 한 번의 클릭을 원했던 것 같다. 그렇다, 난 그런 여자다. 퍼블릭 액세스 컨텐츠와 관련한 연재를 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누가 이글을 볼까, 얼마나 볼까 싶다. 그래도 얼마간의 나의 노동의 대가를 평가받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부정한 방법을 저지른 것이다. 원래 쓰려했던 제목은 ‘퍼블릭 액세스 제작모델의 발상 전환을 위한 일상의 성찰’이었는데 이 진부한 제목을 보고 누가 클릭을 할 것인가 말이다.
뻔하지 않은 제목만큼 뻔하지 않은 영상을 만드는 것도 힘든 것이다. 지난 번 글에서 재미를 운운했을 때 도대체 그 재미에 대한 정체는 뭐냐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맞는 말이다. 사실 지난 글의 의미는 퍼블릭 액세스 영상이 ‘기존 매체의 너무나도 익숙한 전달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에 대한 경계’를 의미했으나 설명이 엄청나게 부족했다, 인정! 표현방식 운운하지만 나 역시 ‘그 모양’인 것을 반성한다. 하지만 지난 글의 숙제는 중요한 연구과제로서 의미는 여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제작모델로서 눈여겨 볼만한 영상을 같이 볼까 한다.
 |
▲ BBC Video Diary 중 알바니아 의사 동영상 보기 (mms://move.cast.or.kr/mediact/act/PA-2/videodairy.wmv) (프로그램 중 앞부분 5‘13“ 발췌) 기획/제작지원 BBC (1991년) * 아쉽게도 자막이 없으나 어렵지 않은 문장이 제법 들려오니 인내를 가지고 보시길 권한다.) |
BBC가 일구어 놓은 유명한 프로그램은 라는 것인데, 이른바 전문제작자가 일반인에게 장비를 지원하고 제작교육을 통해 액세스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70년대 초에는 기획 및 기술적인 지원은 방송국이 맡고 내용은 ‘찾아 간 주체’와 공유하는 식이었는데, 80년대 들어서면서 홈비디오의 출연으로 카메라를 아예 ‘쥐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한 프로그램이 역시 BBC의 인데 장애인, 노동자, 노숙인 등 이른바 사회적 소수자에게 카메라를 직접 들게 만들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담게 하는 방법이다. 마치 짧은 조각 같은 영상들이 소위 ‘셀프 카메라’ 형태로 담겨 있는 영상을 보면 무슨 거대한 일상의 퍼즐을 보는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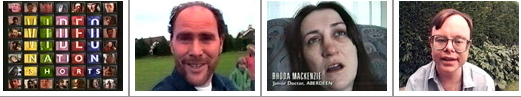 |
▲ BBC Video Nation 중 아이들과 소풍간 가족의 모습, 인력부족인 병원에 힘들게 근무하는 여의사의 눈물, 새로운 시작을 하는 다운증후군 장애인 의 이야기를 발췌한 동영상 보기 (5‘45“) (mms://move.cast.or.kr/mediact/act/PA-2/videonation.wmv) 기획/제작지원 BBC * 역시 자막이 없으나 2분여의 짧은 동영상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막과 관계 없이 프로그램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시청을 권한다. |
사실 셀프 카메라는 매력적이다. 나는 그 매력을 직접 체험해 본 적이 있는데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전국을 들끓기 시작한 2002년이었다. 그해 겨울은 촛불시위로 추모열기를 이어갔지만 실제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대한민국은 월드컵 광기에 뒤덮여 있었다. 당시 나도 월드컵 취재로 정신없긴 마찬가지였지만 어쨌든 정신을 차린 여름께부터는 효순미선 취재에 가속이 붙었는데 그때 의정부 미군부대 앞에서 어른들 사이에 끼어서 데모(?)하던 여고생들을 꼬여서 자신들의 생각을 영상으로 만들게 했던 적이 있다. 미디어교육에 대한 개념 없이 시작된 영상제작의 지난함을 일단 제쳐 둔다면, 내가 가장 신선하게 발견했던 것은 이른바 셀프 카메라 부분이었다. 참여했던 학생들이 4-5명 정도 되었는데 돌아가면서 카메라를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도 찍고 스스로를 찍었던 것이다. 뭐랄까 기대 밖의 성과랄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카메라가 쥐어줬을 때 사람들은 훨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표현하는 구나라는.
현실적으로 액세스를 위해서 영상을 제작할 때 전문제작자(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지만 미디어활동가나 미디어교육 강사, 혹은 독립영화제작 진영을 의미한다)는 어떤 식으로든 결합되어 위치나 역할을 갖게 마련이다. 전문제작자가 ‘기존 매체의 너무나도 익숙한 전달 방식에 쇄뇌’되어 있다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주체’에게 카메라를 직접 쥐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또는 지금 소개할 영상처럼 ‘이야기를 가진 주체의 목소리’를 온전히 재현하되 이른바 전문가의 솜씨를 발휘하는 것이다.
 |
▲ <로지가 양동이를 걷어찬 날> 동영상 보기 (3분 54초) (mms://move.cast.or.kr/mediact/act/PA-2/rozy.wmv) - 농장소녀 멜로리가 얼룩소 로지 덕에(?) 토마토를 얹은 토티아 나쵸칩을 먹게 된다는 내용의 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구성 * 자막 있음^^ |
오늘 소개한 영상들은 나름대로 제작모델에서 전문제작자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관찰을 할 수 있고, 내용적으로는 ‘뻔한 일상’의 모습을 통해 ‘뻔하지 않은 의미’를 발견해 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여기까지 읽고 나서, 우리가 카메라 하나 달랑 들고 현장을 누비는 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찍으라고 할 것이냐, 혹은 전문애니메이터가 어디 그리 흔하냐, 그들이 우리랑 놀아주긴 할거냐 면서 냉소적인 웃음을 지을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쫌만 솔직해 지자. 방법이 정말 없나? 아니면 적극적인 고민이 없는 것인가...
올해 나름대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장장 1년 동안 지속될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참여자는 안산의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사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비디오다이어리를 시도해보려는 야심에 살짝 젖어 봤다. 젖어 보기만 했고 아직 결정을 내리진 못했다. 왜? 쉽지 않은 거 아니까. 혹시 진짜 실행에 옮기게 된다면 간간히 이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는 약속을 하며, 바이...
** 위에서 언급한 BBC의 나 지난 글에서 잠깐 언급했던 캐나다의 그 유명한 <변화를 위한 도전>에 버금가는(?) 퍼블릭 액세스의 실험을 위한 프로젝트, 전국적으로 14개 지역에서 26개 단체/공동체가 참여하고 수많은 미디어 활동가들이 결합한 이른바 공동체 액세스 프로젝트가 2006년 방송위원회 시청자단체활동 지원사업에서 탈락했다. 한국 퍼블릭 액세스의 저변을 확대하고 진정한 액세스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이 담긴 중대한 의미를 몰라보고 홀라당 떨어뜨린 방송위원회! 반성하기 바란다.
- 이상 방송위의 퍼블릭 액세스 지원정책에 항의하는 강수연 개인의 1분 성명이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