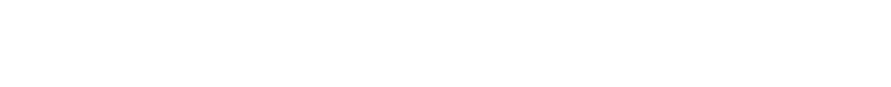김성윤
문화사회연구소라는 곳에서 연구원 겸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중문화와 하위문화를 연구해 왔고, 최근에는 대중의 정서 구조 변동에 관심을 두고 있다.
#1
작년 이맘때 어스름 저녁이었다. 학교 연구실로 들어가던 중 뜻밖의 소리를 들었다. “여기 예쁜 여학생 있어요!” 축제 중이었다. 주점 행사를 홍보하던 학생이 호객을 위해 외치는 소리였다. 옆에 있던 ‘그’ 예쁜 여학생은 살짝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축제 주점에 끼워 줄 정도로 내가 젊어 보였겠지만, 한편으론 불쾌한 기분을 주체할 길이 없었다. 성추행 교수를 몰아내기 위해 반-성폭력 운동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저 따위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건가.
“여기, 예쁜 여학생 있어요!” … 규범 위반의 축제?
이맘때쯤 캠퍼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과잉 문화화된다. 중간고사가 끝났기 때문이다. 그토록 고대하던 축제 시즌. 사실 나같이 문화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축제라는 말은 묘한 기분을 자아낸다. 일상이 정지되고 그 무엇이 됐든 정해진 패턴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과잉 문화화’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대학생들의 축제 문화가 지나치다든가 비정상적이라고 고깝게 여길 필요는 없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를 살아가는 인간이 자신의 신경을 오로지 문화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일 아닌가. 그 어떤 도덕적 잣대로도 축제의 발랄함과 발칙함을 재단할 수는 없다.
대학 축제 역시 그런 의미일 것이다. 시간의 흐름을 중지시킨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고등 교육마저 취업으로 가는 길목이 되어 인간이라기보다는 기계로서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이들 예비 노동자 또는 예비 백수에게 축제는 제한적이나마 해방의 경험을 누릴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웃고 떠들고 마신다. 즐겁지 않으면 축제가 아니겠지만, 사실 축제의 기능에는 즐거움 이외의 것들도 있다. 일상의 시간을 중지시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충만하지만, 그러다 보니 종종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위반하는 생각과 표현들이 공유되곤 한다.
‘오원춘 세트’를 비롯해 엽기에 가까운 일일 주점 차림표가 전파를 탄다든가, 접대부나 메이드 복장 같은 옷차림으로 호객 행위를 하는 학생들이 구설에 오르면 사실 판단이 잘 안 설 때가 많다. 뭔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축제는 어떤 선을 넘도록 허용된 시공간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런 표현들은 일종의 인지 부조화를 통해 웃음을 유발해 내려는 의도로 읽힐 수도 있다. 안주에 성희롱에 가까운 이름을 붙이고 ‘여대생’답지 않은 옷을 입고 희희낙락하고 있다면, 그건 그들이 자신을 둘러싼 성적이거나 사회적인 규범을 위반했기 때문에 나오는 웃음이 아닐까.
즐거움만으론 많은 걸 설명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예전에는 이런 즐거움만 갖고도 상징적 저항 운운하면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일베마저도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세상이다. ‘어차피 맘 놓고 놀라고 있는 게 축제 아닌가요?’라고 반문한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문제는 이들의 막 나가는 상상력을 제어하기 위해 흔한 도덕적 잣대 따위를 들이대는 게 너무 뻔하고 또 촌스럽다는 데 있을 것이다. 그 어떤 지점에 이르러 우리는 비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건 아닐까.
스펙터클과 사교로 가득한 공동체 ‘효과’
대학 문화가 죽어간다는 진단이 난무한 가운데, 일일 주점을 중심으로 대학 축제가 들썩인다는 건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주점만 놓고 본다면 대학 문화는 흥겹기만 하다. 아, 여기에 빼먹은 게 하나 더 있다. 가수들이 행사 뛰러 왔을 때도 캠퍼스는 여느 시장통 부럽지 않게 북적인다. 저마다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연예인의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런 광경을 두고, 과거 대동 놀이 시절의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이제는 개인들끼리 파편화됐다고 판단한다면, 그건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판단이다. 마찬가지로 도덕적·미적 수준이 예전만 못하다고 예단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행사장과 주점에서 이들은 이전의 어떤 선배 세대들 못지않은 문화적 경험과 공동체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통된 대상을 통해 공통된 감각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공동체 아닌가. 다만 민중적·민족적 신념이 아니라 뭔가 색다른 것들을 통해 공통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대학 축제 동안 불현듯 나타나는 공동체란 ‘셀러브리티 공동체’ 또는 ‘사교 공동체’로 해석된다. 캠퍼스에 마당 문화 대신 (학생 집회를 봉쇄하고 경관을 장식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써) 극장 문화가 공간적 이념으로 자리했다는 건 의미심장한 일이다. 축제 행사에서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을 바라보게 되는데, 시선의 소실점에 자리한 ‘셀럽’과 그들 사이에 무형의 스크린이 만들어지고 더불어 전에 없던 스펙터클이 창조되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회 예산 규모에 따라 ‘급’이 다른 연예인이 초대되고 그에 맞춰 동원 규모가 달라지므로, 이때의 공동체적 경험이란 결국 재무적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된 공동체들에 의한 것이기는 하다.
그런가 하면 주점에선 더할 나위 없이 평등한 관계들이 만들어진다. 주점용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마련하고, 요리·서빙·호객·공연 등 역할 분담도 체계적이다. 비록 단 며칠뿐이기는 하지만, 취업-기계로 전락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조직력이다. 쿵쾅거리는 음악에 삼삼오오 테이블마다 수다로 시끌벅적하다. 축제의 무게 중심이 주점이 됐다는 것도 흥미롭다. 상대 평가니 스펙 쌓기니 하지만, 적어도 이날 하루만큼은 각자도생의 시계가 멈추고 전에 없던 사교적 관심과 대화들이 오간다. 가까이서 보면 여지없는 술판이지만, 멀리서 보면 충분히 아름다운 사교 네트워크다.
물론 축제 때 이들이 만들어 내는 공동체 효과가 모두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누군가는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힐난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축제 자체가 소비적 활동임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오히려 충분히 소비적이지 못해서 문제라면 문제랄까. 이들의 움직임에선 한없이 낭비에 가까운 소비가 부족한 게 차라리 아쉽다. 서로에게 불편과 폐를 끼침으로써 기꺼이 흉금을 트는 계기들은 좀처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단속하면서 최소한의 존재론적 동일성을 유지하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넘어서는 규범, 종속하는 규범
축제 현장만 놓고 본다면, 대학생들은 전혀 기대치 않은 곳에선 주어진 규범을 넘나들지만, 여전히 어떤 규범들에는 종속적이다. 축제는 축젠데 그건 일상을 전혀 다른 식으로 빗겨 가는 축제다. 비겁해서일까, 영리해서일까, 아니면 그들 자신이 더 깊은 셈을 하지 못해서일까. 어쩌면 오늘날 대학 축제는 자본주의가 그만큼 고도로 심미화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징표인 것 같기도 하다. 반항하고 즐겨라. 단, 너에게 이로운 한에서. 분명 어떤 선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넘어선다는 건 언제나 어렵다. 그마저도 축제가 끝나고 나면 이들은 다시금 기계 같은 일상으로 되돌아갈 것이고.
#2
밤늦게 연구실에서 나올 때쯤 주점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그것도 교수 연구동 바로 앞에서. 힙합을 비롯한 최신 히트곡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레이저 쇼라도 하는지 별난 광선들이 어지럽게 춤을 췄다.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연구에 여념이 없는 교수들을 방해하기 위한 거라면 박수라도 쳐 주고 싶었다. 그걸 의식하고 난장을 피운 거라면 제법 ‘신박’하지 않은가. 하지만 그날 저녁의 호객 행위가 떠오르자 다시금 마뜩잖은 기분이 들었다. 퍼뜩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도서관 앞에선 저렇게들 못 놀겠지. 그곳은 성역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