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동자들의 투쟁은 언제나 치열하고 그 외침은 절규에 가깝다. 그러나 사측이나 정부의 버티기, 또는 무시하기는 언제나 한결같기만 하다. 더 이상 갈 곳을 찾을 수 없는 노동자들의 행동은 거리에 천막을 치고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농성으로 남는다. 농성은 가진 것 없고 더 이상 내몰릴 곳이 없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장기투쟁의 시작이며, 단식을 하거나 삭발을 하는 그야말로 온 몸을 다 내거는 숨 막히는 투쟁의 집결체이다.
농성장에 가보면 허름한 천막에 비닐로 칭칭 감아 추위를 피하고 그 위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리는 현수막이며 포스터. 구호 피켓 등이 어수선하게 걸려있으며 농성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핏기 없는 얼굴에 삶의 고단함이 역력히 드러나 시민들과 소통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다.
힘든 투쟁의 모습은 오가는 시민들에게 어쩌면 역으로 거리감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다는 당위성으로 모든 것이 소통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고민을 해본다.
재테크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농성장을 그저 이질적인 공간으로 스쳐지나갈 뿐이며 하찮게 내려다보기를 서슴치 않는다. “농성장의 이들과 난 다르지” 라며 스스로의 계급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거리를 오가는 이들은 농성장을 피해서 돌아가거나,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욕을 하거나,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며 짜증을 내기도 한다. 무엇이 서로에게 관심이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만들었을까? 거리의 흉물로 남기엔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도 절실하지 않은가!
거리의 우뚝 솟은 건물들 사이로 수천만 원이 넘는 조형물이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으로 꼿꼿하게 서있는 현실에서, 공공미술이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현실에서 공공미술은 노동자를 포함한 일반인들을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문화적 공유를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농성장을 재구성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농성장이 거리의 흉물로 남을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주장을 알리고 오가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투쟁을 함께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적 공간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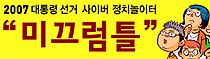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