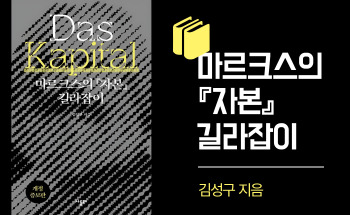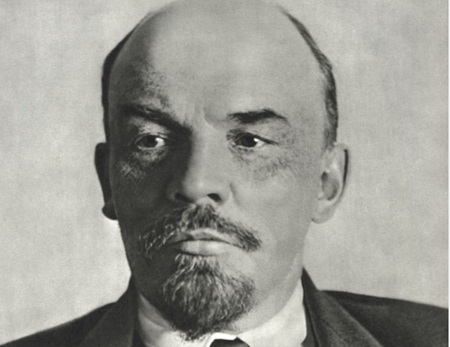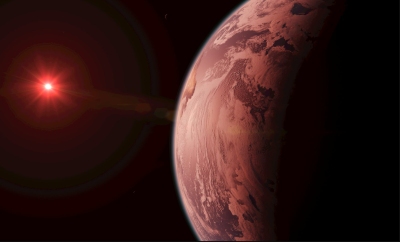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은 <철학 살롱>(The Philosophical Salon)에 발표한 최근의 도발적인 글 ‘왜 공산주의자는 삶이 지옥임을 전제로 해야 하는가’(Why a Communist Must Assume that Life is Hell)에서, 혁명적 사유의 정치적·실존적 함의를 근본적으로 다시 사유하도록 만든다. 이 글에서 지젝은 마르크스주의에 다시 개입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날 대다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불편해할 정도로 거칠고 날카로운 방식이다. 그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낙관주의는 물론, 인간 해방을 둘러싼 거의 성역처럼 여겨지는 이상화된 상정 자체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다. 억압, 착취, 소외의 끝없는 순환에 다시금 직면하고 있는 지금, 지젝은 혁명을 구원의 희망이나 유토피아적 사회의 수립이라는 낭만적 전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혁명이란 삶이 실제로 ‘지옥’이라는 가혹한 실존적 현실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삶은 고통과 투쟁으로 가득한 세계이며, 이상주의적 사고나 형이상학적 초월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젝에게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 존재의 투쟁에 대한 철저히 변증법적인 접근이다. 그는 혁명이 고통의 종식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정면 대결이라고 본다. 즉, 손쉬운 해방이나 완전무결한 미래라는 환상에 눈이 멀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이다. 지젝의 마르크스주의는 기존의 유토피아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상 사회를 향한 선형적 진보를 추구하는 대신, 그는 혁명 과정이 인간 본성의 한계와 고통의 불가피성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본다. 필자가 보기에 지젝의 ‘필립 마인랜더(Mainländer,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비관주의 독해’는 많은 동시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외면하고 싶어 하는 급진적 비판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 비판은 공허한 낙관주의와 맹목적인 쾌락주의를 넘어서야 할, 정교한 마르크스주의적 시야를 요청하고 있다.
 출처: Unsplash, nikko macaspac
출처: Unsplash, nikko macaspac
지젝의 현대 마르크스주의 비판은 결코 혁명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혁명이 얼마나 쉽게 이상화되고 단순화되는지를 문제 삼는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19세기 독일의 급진적 비관주의 철학자 마인랜더의 사상과 다시 접속하려는 데 있다. 마인랜더는 모든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는 사실에 기반한다고 봤으며,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표는 고통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젝은 이 아이디어를 끌어와 핵심적인 지점을 강조한다. 고통의 현실을 회피한 채 건설되는 혁명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마인랜더의 비관주의는 체념의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이 인간 삶의 피할 수 없는 구성 요소임을 인식하고, 그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자는 촉구다.
그러나 지젝이 마인랜더를 끌어오는 방식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많은 마르크스주의자에게 있어, 특히 혁명정치와 관련된 비관주의는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진다. 마르크스주의는 오랫동안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 즉 인간 역사가 더욱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과 결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주의는 역사적으로 재앙을 초래해온 바 있다. 많은 혁명들은 정의의 만개로 이어지지 않았고, 새로운 형태의 폭정과 억압으로 귀결되곤 했다. 그렇기에 지젝의 비판은 이상주의의 한계를 되새기게 한다. 그의 독해에서 마인랜더의 비관주의는 마르크스주의에 만연한 순진한 낙관주의에 대한 필요불가결한 교정 역할을 수행한다. 지젝은, 완벽한 미래에 대한 허망한 약속을 거부할 때 비로소 마르크스주의는 인간 조건을 규정짓는 고통의 지속적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젝의 비판이 아무리 날카롭다 하더라도 이에 도전하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이자 필자인 툰치 튀렐(Tunç Türel)은 지젝의 글에 대해 열정적인 낙관주의의 옹호로 응답했다. 튀렐은 지젝의 마인랜더 비관주의 해석을 거부하며, 마르크스주의는 설령 엄청난 노력과 투쟁을 필요로 하더라도 인간 해방이 가능하다는 신념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튀렐의 응답은 여러 면에서 지젝의 입장에 대한 정면 반론이다. 그는 희망과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갖지 않는다면, 어떤 혁명 프로젝트도 필연적으로 공허한 허무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튀렐에게 마르크스주의란 단지 물질적 조건으로부터의 해방만이 아니라, 지젝의 비관주의가 자칫 강화할 수 있는 실존적 절망으로부터의 해방을 향한 실천이어야 한다.
튀렐의 낙관주의는 충분히 이해 가능한 것이지만, 지젝의 비판이 지닌 핵심 교훈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지젝의 마르크스주의는 혁명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조건을 훨씬 더 정직하게 마주하자는 요청이다. 지젝은 혁명을 고통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고통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과정으로 본다. 이는 지젝이 절망이나 체념을 옹호한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혁명은 인간 삶에서 고통이 피할 수 없는 요소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젝은, 이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할 때에만 우리가 보다 진정한 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고통의 종식이 아닌, 고통과 맺는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해방이다.
튀렐의 응답이 지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지젝이 말하는 마르크스주의가 마주하려 했던 인간 고통의 구조를 다시 은폐해버린다는 점이다. 튀렐은 낙관과 희망을 강조함으로써 혁명과 인간 해방이라는 개념을 이상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인간 조건의 복잡성과 내적 모순을 흐릿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지젝이 상기시키듯, 혁명이란 자동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가져오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 중 가장 어두운 측면과 대면하는 싸움이다. 단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만으로 이뤄질 수는 없다.
지젝의 글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는 마인랜더를 포함해 서구에서 해석된 불교에 대한 비판적 재조명이다. 특히 현대 서구에서 수용된 불교는 종종 개인적 초월의 철학, 즉 삶의 고통으로부터의 개인 해방의 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런 개인주의적 해석은 고통의 사회적·집단적 차원을 간과한다. 서구 불교의 문제는 고통을 초래하는 조건들에 맞서 싸우는 집단적 투쟁보다는, 고통으로부터의 개인적 탈출에 치우친다는 점이다. 마인랜더의 비관주의는 비록 불교의 집단적 해방 측면을 과소화하긴 했지만, 이 지배적 관점에 대한 급진적인 도전을 던진다. 고통을 초월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보편적 실재성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젝은 이 ‘급진적 내재성’을 진정한 혁명적 사유의 기초로 본다.
여기서 지젝의 불교 비판은 마르크스주의 이상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과 맞물린다. 서구 불교가 삶의 가혹한 현실로부터 도피로 작동하듯, 이상주의적 마르크스주의 역시 유토피아적 전망을 좇으며 인간 고통의 복잡성과 깊이를 외면할 수 있다. 인간 해방이라는 이상에만 몰두하다 보면, 삶이 본질적으로 일정 정도 ‘지옥’이라는 근본적인 실존적 현실을 놓치게 된다. 고통은 초월하거나 도피할 대상이 아니라, 정면으로 대면해야 할 현실이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전환적인 혁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젝의 마르크스주의는, 결국 인간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기초로 혁명을 조직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고통이 사라진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혁명이 아니라, 고통과 맺는 우리의 관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혁명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튀렐의 낙관주의는 희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실상을 더 깊이 이해하자는 요청 앞에서 충분하지 않다. 혁명은 고통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고통과의 정면 대결이어야 한다. 인간 존재의 어두운 현실을 응시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하고 지속적인 해방에 다다를 수 있다.
따라서 지젝의 도발은 우리로 하여금 혁명이라는 개념의 본질 자체를 재사유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쓰고 있던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일이기도 하다. 낙관주의에 근거한 반론들이 분명 찬사를 받을 만하지만, 그것은 지젝이 강조하는 고통의 깊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지젝의 이 사유는 결코 과대망상적 발언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정한 지적 각성에서 비롯된 성찰이다. 진정한 리더십은 결국 혁명의 이름으로 학살 기계를 만들었던 소련 볼셰비즘이나 폴 포트의 캄보디아가 아니라, 사회적 혁명 속에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출처] The Revolutionary Dialectic of Suffering: Beyond Utopianism and Nihilism
[번역] 이꽃맘
- 덧붙이는 말
-
닐란타 일랑가무와(Nilantha Ilangamuwa)는 언론인이자 정책 분석가다. 그는 <스리랑카 가디언>(Sri Lanka Guardian)』의 창립 편집자이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