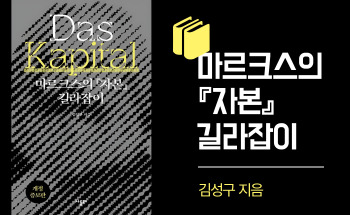출처: James Wiseman, Unsplash
출처: James Wiseman, Unsplash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 형태의 통치 방식이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2024년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21개국에서 대통령 선거, 입법 선거 또는 지방 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유익하다.
선거 중 여덟 건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로 간주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경우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 또 다른 여덟 나라에서는 선거 결과 집권 세력이 권력을 유지했지만, 야당이나 국제 관측단이 그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다섯 건의 선거는 과거의 쿠데타나 기타 사건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연기됐다.
여덟 건의 공정한 선거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나라들이 대부분 오래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곳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서아프리카의 세네갈, 가나, 카보베르데(Cabo Verde), 남아프리카의 보츠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모리셔스,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있는 소말릴란드는 모두 아프리카 거버넌스 이브라힘 지수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며,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이들을 자유국(또는 세네갈과 소말릴랜드의 경우 부분적으로 자유국)으로 분류했다.
이들 대부분에서는 야당이 승리해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
보츠와나는 듀마 보코(Duma Boko)가 이끄는 민주주의 변화의 우산(Umbrella for Democratic Change)이 승리하며 58년간 집권했던 보츠와나 민주당(Botswana Democratic Party)이 결과를 평화적으로 수용하면서 민주주의와 안정성의 본보기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가나에서는 전국민민주회의(National Democratic Congress)와 신애국당(New Patriotic Party) 간 8년 주기의 정권 교체가 이어졌고, 이번에는 2012~2017년 대통령이었던 존 마하마(John Mahama)가 단 한 차례의 투표로 다시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카보베르데에서도 독립 이후 두 정당이 번갈아 정권을 쥐어왔고, 이번에는 아프리카 독립당(PAIGC)이 22개 시의회 중 15곳을 장악하며 이전 선거에서 14곳을 차지했던 민주운동(MpD)의 상황을 뒤집었다.
세네갈의 경우, 선거 과정이 더 혼란스러웠다. 전 대통령 마키 살(Macky Sall)이 선거를 무기한 연기하려 했지만, 대규모 시민 시위가 이를 막아냈고, 파스테프(PASTEF)의 디오마예 파예(Diomaye Faye) 대통령과 우스만 송코(Ousmane Sonko) 총리가 승리했다. 11월 총선에서도 유권자 다수가 PASTEF를 지지했다.
모리셔스에서는 정부가 소셜미디어를 일시적으로 차단하자 시민들이 시위에 나섰고, 그 결과 야당 연합인 '변화 동맹'(Alliance du Changement)의 후보 나빈 라무굴람(Navin Ramgoolam)이 총리를 압도적으로 꺾었다.
소말릴랜드는 이웃 국가 에티오피아만이 승인한 독립국으로, 선출된 제도와 전통적 정통성을 가진 제도를 결합한 정치 체제를 실험하고 있다. 원로회의(Chamber of Elders)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연기했고, 그 후 치른 선거에서 2017년부터 집권한 대통령을 대체할 야당 후보 압디라흐만 모하메드 압둘라히 ‘이로’(Abdirahman Mohamed Abdullahi "Irro")가 승리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미비아에서는 기존 집권당이 다시 승리했지만, 남아공의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가 이끄는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했다. 나미비아에서는 최초로 여성 대통령인 네툼보 난디-은다이트와(Netumbo Nandi-Ndaitwah)가 국가 수장이 됐다.

문제 제기된 여덟 건의 선거
다른 여덟 개국에서는 선거가 어느 정도 논란을 낳았고, 일부에서는 시위와 보안군과의 충돌로 이어졌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프리덤하우스에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차드는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며, 선거 독재 국가로 볼 수 있다. 대통령중심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방식은 다양하다.
모잠비크와 탄자니아는 남아공과 나미비아처럼 지배 정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 나라에서는 권력 유지를 위해 권위주의적 수단을 동원했다.
모잠비크에서는 프렐리모(모잠비크 해방전선, FRELIMO)의 다니엘 차포(Daniel Chapo)가 대통령 선거에서 70.7%를 얻으며 승리했지만, 포데모스(Podemos)의 벤란시오 몬들라네(Venancio Mondlane) 지지자들이 선거를 부정선거라며 항의했고, 보안군의 폭력 진압으로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
탄자니아에서는 집권당 CCM이 지방 선거에서 거의 99%의 득표율로 승리하며 신뢰성을 의심받았고, 선거 제도의 허점과 야권 탄압은 2025년 대선을 앞둔 우려를 키웠다.
르완다에서도 폴 카가메(Paul Kagame)가 이끄는 르완다애국전선(RPF)의 정통성이 1994년 집단학살을 종식한 전쟁에 기반한 채 유지되고 있다. 야권과 비판 여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카가메가 99% 이상 득표한 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민주적 수단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헬 지역의 모리타니에서는 모하메드 울드 가지와니(Mohamed Ould Ghazouani)가 비교적 평화로운 환경에서 두 번째 선거를 치르며 점진적인 민주화 경로를 밟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반노예운동가이자 야당 지도자인 비람 다 아베이트(Biram Dah Abeit)는 이를 ‘선거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차드에서는 2021년 부친 사망 직후 쿠데타를 일으킨 마하마트 데비(Mahamat Déby)가 5월 대선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했고, 이후 열린 총선과 지방 선거에서 야권이 보이콧하면서 여당이 손쉽게 승리했다.
인도양의 마다가스카르는 2023년 11월 야권의 보이콧과 낮은 투표율 속에 안드리 라조엘리나(Andry Rajoelina)가 논란 속에 대통령으로 재선되었고, 그를 지지하는 연합이 42%의 득표율로 의회 과반을 차지했다. 2013년 이후 민주화 흐름이 이어졌지만, 실제 진전은 정체됐다.
코모로에서도 여러 부정행위 속에 아잘리 아수마니(Azali Assoumani)가 또다시 대통령직에 올랐다.
기니만의 토고에서는 대통령 포르 냐싱베(Faure Gnassingbé)의 여당이 총선에서 압도적 우위를 유지했고, 그는 1967년부터 집권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권력을 이어받은 정치 왕조의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열리지 못한 다섯 건의 선거
2024년에는 다섯 개국에서도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전쟁, 쿠데타, 그리고 집권 세력의 결정으로 인해 선거가 열리지 못했다.
말리(2020년)와 부르키나파소(2022년)에서는 사헬 지역에 불어닥친 쿠데타의 여파로 예정된 선거가 무기한 연기됐다.
남수단에서는 2011년 수단에서 독립한 이후 대통령 선거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여러 차례 연기됐고, 키르 마야르디트(Salva Kiir Mayardit) 대통령과 리에크 마차르(Riek Machar) 부통령이 대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는 2026년으로 미뤄졌다.
앙골라에서는 2022년 대선과 총선에서 간신히 승리한 조앙 로우렌수(João Lourenço)의 집권당 MPLA가 지방 선거를 2027년으로 연기했다. 이는 권력이 흔들릴 가능성 때문일 수 있다.
기니비사우에서는 우마로 시소코 엠발로(Umaro Sissoco Embaló)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경향과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대선이 2025년 11월로 연기됐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대륙의 미래
대부분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는 정부 수반, 입법부, 지방 권력자를 보통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2024년에는 일부 국가에서 이 제도가 정권을 평화롭게 교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2025년이 끝날 무렵까지 16건의 추가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1990년대 민주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선거 독재’라 불리는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선거가 주기적으로 열리지만, 비민주적인 수단(후견주의, 탄압, 부정 등)으로 정권이 유지된다.
최근에는 쿠데타의 증가뿐 아니라 정치적 권리와 언론의 자유 약화, 낮은 투표율 등이 다당제 민주주의 체제의 공고화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서사헬 국가들처럼 분쟁이 지속되는 지역은 국가의 통치권과 인권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
30년 전 정치 개혁을 유도하던 세계적 분위기는 크게 바뀌었다. 2000년대 이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들은 아프리카 내 시민사회나 민주화 세력을 지원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주화의 전성기에도 자유주의 국가들은 아프리카인들의 권리보다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우선시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도 더 큰 정치적 책임, 안전, 반부패, 공정한 자원 분배는 여전히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선거장에서, 거리에서, 혹은 무능하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맞선 쿠데타를 지지할 때 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로 남아 있다.
정치·사회적 권리를 확대하려는 투쟁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아프리카인들, 그리고 그들의 지역기구 손에 달려 있다. 1990년대 자유민주주의 모델을 바탕으로 시작된 민주화의 흐름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출처] Radiografía electoral del África subsahariana: 21 países y tres realidades
[번역] 하주영
- 덧붙이는 말
-
알리시아 캄포스 세라노(Alicia Campos Serrano)는 마드리드 자치대학교(Universidad Autónoma de Madrid) 사회인류학과의 부교수이며, 아프리카 연구와 국제 관계의 인류학 및 역사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