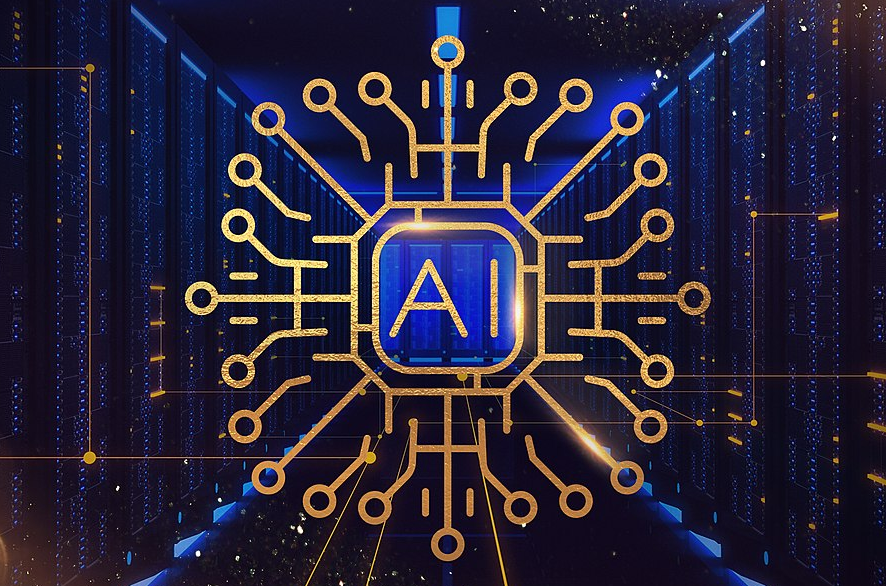잠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와 연방준비제도(Fed) 간의 소동을 잊자. 6개월 전 상황으로 돌아가 지난 50년 동안 존재했던 상황을 살펴보자.
한쪽에는 매우 크고 중요한 신자유주의자 집단이 있었다. 퀸 슬로보디안(Quinn Slobodian)이 그의 훌륭한 저서 ⟪글로벌리스트: 제국의 종말과 신자유주의의 탄생⟫(Globalists: The End of Empire and the Birth of Neoliberalism)⟫(내 서평은 여기서 볼 수 있다)에서 기록했듯이, 몽펠르랭 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 1947년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를 중심으로 창립된 국제적 학술·사상 네트워크로, 신자유주의 경제사상의 형성과 확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단체)에서 결집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친자본주의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승리해 입법 및 행정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다. 그들은 좌파, 사회주의, 그리고 포퓰리즘 정당들이 더 자주 승리해 집권할 수 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우려했다. 그렇다면 경제 정책 결정권을 그런 정당들의 사회주의적 충동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해결책은 국가의 많은 기능을 입법부와 행정부의 감독에서 점진적으로 제외하고, 그것을 순전히 기술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들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통화 및 재정 정책, 기업 규제 등을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적절한 기술적 사안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의사 결정은 집권 정당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이러한 기관들은 자본 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의 독립성 뒤에 숨은 이데올로기였고, 정부의 다른 경제 부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사실 여기서 “독립성”이라는 말은 공익을 대변하는 선출직 공무원들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했다. 슬로보디안이 쓴 대로 신자유주의자들은 이 모든 것을 “도미니움(dominium)”과 “임페리움(imperium)”이라는 구분 속에 담았다. “도미니움”은 경제 권력이 전문가들에게 있는 영역을 뜻하는 반면, “임페리움”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국기 게양,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 악대와 함께 행진하는 것과 같은 상징적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들은 금리, 과세, 기업 규제, 자본 이동을 결정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모든 실질적인 의사 결정은 “도미니움”에서 이루어졌다.
이 접근법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주도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중앙은행의 “탈정치화”를 도입했고, 일부 다른 경제 의사결정 기술 부문에도 적용되었다. 아래 그래프는 최근 애덤 투즈(Adam Tooze)에게서 가져온 것으로, 1990년대 말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부유한 국가들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일부였고,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도 그대로 모방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그런 세계관에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우리는 우연히 이 접근법이 현재 중국의 접근법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통둥 바이(Tongdong Bai)가 그의 저서 ⟪정치적 평등에 반대한다⟫Against Political Equality)(내 서평은 여기서 볼 수 있다)에서 주장했듯이, 정치 영역 전체는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의 기술적 관리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대중적 감독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러한 감독은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 우리는 의사들의 결정에 대해 대중 투표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고도로 복잡한 경제 및 정치 문제도 교육을 받은 유능한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선출된 정부의 문제는 바로 그러한 의사결정에서 물러나 있지 않다는 데 있으며, 경제와 정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 선출된 정부일 경우 그 문제는 더욱 악화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관점은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반대자들을 불러왔다. 우리는 이 반대자들의 진영을 “민주주의 진영”이라고 부르자. 이들은 경제에 관한 결정은 합법적이기 위해 다른 어떤 정부 결정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선거와 민주적 인준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가 선거 연령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는 것처럼, 이자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 문제는 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문제보다 더욱더 대중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점점 더 많은 사안들이 전문가-관리 계급에 의해 결정된다면, 민주주의와 선출직 공무원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국가 대표단을 이끌고 국가를 합창하기 위해서인가?
이것이 두 진영이 서로 맞서는 방식이었다.
여기서 트럼프가 등장한다. 그는 연방준비제도를 통제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가 민주주의 진영에 합류하는 것일까? 전혀 아니다. 그가 하는 일은 신자유주의적 의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어떻게 신자유주의적 의제의 일부가 되었는지를 떠올려야 한다. “전통적”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과 생각을 같이하는 보수 정치인들과 정당들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할 능력에 대해 비관적이었다. 경제 기관의 독립성을 옹호하는 것은 호의적이지 않은 정치인들이 집권할 경우 “나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비관적이고 수세적인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낙관적이고 공세적인 신자유주의자다. 오늘 트럼프가, 내일은 그와 비슷한 정치인들이 정치 권력을 잡고 있다면, 왜 그들이 모든 경제 기관을 장악하지 말아야 한단 말인가?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도 이를 승인했을 것이다 — 단, 그들은 그런 정치인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나치게 회의적이었다는 점만 빼고 말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렇지 않다.
결국 트럼프와 “전통적” 신자유주의자들 사이의 핵심 차이는 신자유주의자들이 경제 기관을 통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장기적 통제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지 비관적인지에 달려 있다. “전통적” 신자유주의자들은 비관주의자들이었고, 트럼프는 낙관주의자다. 그는 신자유주의자들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진영이 당분간 세계를, 그리고 확실히 미국을 지배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다면 왜 연방준비제도 역시 지배하지 못하겠는가?
[출처] Trump: Neoliberal agenda pursued by direct means
[번역] 이꽃맘
- 덧붙이는 말
-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는 경제학자로 불평등과 경제정의 문제를 연구한다. 룩셈부르크 소득연구센터(LIS)의 선임 학자이며 뉴욕시립대학교(CUNY) 대학원의 객원석좌교수다. 세계은행(World Bank) 연구소 수석 경제학자로 활동한 바 있으며, 메릴랜드대학과 존스홉킨스대학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