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터 회의 소설, <콰이어트 걸>에는 특별한 청각 능력을 지닌 주인공 카스퍼가 등장한다. 그는 상대방이 내는 소리의 빠르기, 높낮이 등으로 그 사람을 파악할 뿐 아니라 도시의 다양한 소리를 들으며 각각의 장소를 다르게 이해한다. 리듬분석이 단지 뛰어난 청각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카스퍼와 리듬분석가는 '볼 수 없는 것'을 듣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볼 수 없는 것'이란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죽은 사람을 볼 때, 그 위에 떠 있는 '죽음'이라는 사건과 같은 것이다. 페르파르트는 <볼 수 없는 것의 생태학>이란 글에서, 오늘날 서서히 '볼 수 없는 것'이 사라져 가는 듯한 새로운 정치 사회적 형태가 출현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지의 전적인 가시성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시성 체제를 르페브르는 현전과 현재의 구별로 이야기한다. 현재의 가시성들이 마치 현전하는 듯 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마주리imagerie(사진, 영상 등)는 일상을 생산하고 주입하고 수용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마주리는 사진이 찍힌 인물에 접근하듯이 실재와 현전성에 접근한다. 그러나 겉모습은 닮았을지 모르나 깊이도, 두께도, 살도 지니지 못한다." 이러한 스펙타클은 TV 화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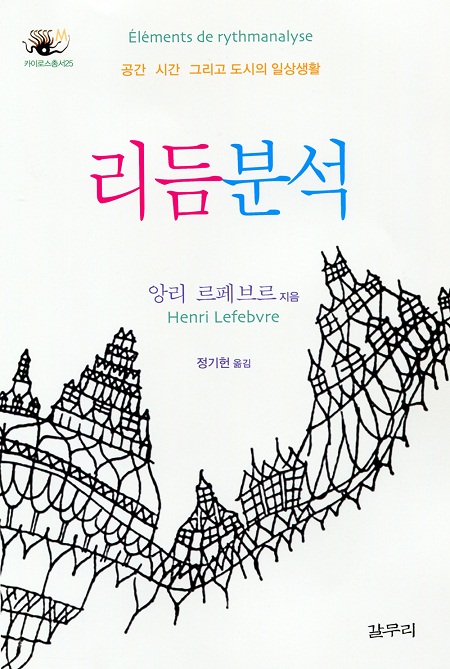 |
르페브르는 정원을 예로 든다. 나무가 있고, 풀과 벌레가 있다. 이러한 정원은 항속성과 공간적 동시성 속에서 공존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 동시성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표면을 뚫고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보라... 그저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 들어보라. 각각의 풀과 나무들이 저마다 복수의 리듬들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즉 "이 정원과 '대상들'을 다리듬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 '대상'은 정지된 '사물'이 아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본다. 그리고 그 위에 떠 있는 '죽음'이란 사건을 떠올린다. 이 사건은 시공간 속에서 어떤 리듬을 가진 움직임이다. 그 리듬을 따라가는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사건과 연결된 전쟁, 질병, 사고 등과 같은 더 큰 사건으로, 사건의 무대로 연결된다. 때문에 부동의 상태에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자신의 리듬을 갖고 있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상태로 존재한다. 정지된 '사물'을 뚫고, 이 '볼 수 없는 것'을 듣는 것, 아마도 이것이 리듬분석이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어떤 카메라, 어떤 이미지 혹은 이미지의 연쇄도 이 리듬을 보여줄 수 없다." 르페브르는 '인간은 세계의 척도'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가 우리의 구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이 구성은 칸트 식의 선험적인 범주가 아니라 우리의 감각과 우리가 소유한 도구들과 관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펼쳐진 세계는 우리의 감각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르페브르는 '몸'을 리듬분석의 기준으로 삼는다. 리듬분석가는 자신의 몸을 통해 리듬을 배운 후에 외부의 리듬을 파악한다. "그의 몸은 메트로놈 구실을 한다."
몸이 분석의 기준이라면, 그것은 구성의 출발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 르페브르에게 리듬분석은 그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왔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의 일환이다. 이 일상은 시계를 통해 양화된 시간(선형적인 시간)과 생체적 리듬(우주적, 순환적 시간)의 상호작용 속에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산업생산의 노동이 지배적이 된 시대에서는 시계시간이 우위를 점하지만, 그것에 대한 투쟁 또한 첨예해진다. 그러면 다른 시간은 없는가? '전유된 시간'은 르페브르가 '당분간'이란 단서를 달긴 하지만 어쨌든 고유의 성격을 가진 시간이다. 이 시간은 어떤 활동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가져다 줄 때 도래하는 시간이다. 이 활동은 "자신 그리고 세계와 일치를 이루며, 외부에서 부과된 강요나 의무가 아닌 자기 창조, 재능의 일면을 포함한다." 즉 시간을 전유하는 것은 자기준거에 기반한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것은 세계의 구성이 우리의 감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쩌면 '볼 수 없는 것'을, 사건의 리듬을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닌지도 모른다. 앞에서 언급한 페르파르트는 '볼 수 없는 것'의 영역이야말로 본질적인 것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이 영역이 다양한 잠재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이화 과정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볼 수 없는' 영역에 있는 리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외부에서 부과된 강요나 의무가 아닌" 특이성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 말이다. 그것이 '전유된 시간'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닐까? 그런데 르페브르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리듬을 만들어 내는 것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리듬은 실체도 물질도 사물도 아니며, 어떤 요소들 간의 관계도 아니기 때문이다. 리듬이라는 개념은 '실체적인 것-관계적인 것'의 측면을 모두 갖지만 그것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그 이상의 무언가를 내포한다. 이 무언가를 위해 르페브르는 에너지라는 개념을 가져온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이 에너지 또한 어떤 리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리듬은 시간-공간-에너지를 연결하는 고리이며, 리듬을 만든다는 것은 시간-공간-에너지를 새롭게 구성하는 일이 된다.
우리가 도시의 리듬을 듣는 일을 단지 음악 감상과 같은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리듬을 파악하는 것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새로운 리듬을 형성하는 것이, 시간을, 공간을, 전유하는 에너지가 '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사건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의미심장하다. "사유는 그것이 실천 속에 진입하는 순간 완성된다. 즉, 사용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떠오른 장면은 이런 것이다. 한 해변가의 휴양지 마을에 있을 때, 갑자기 동네 전체가 정전이 된 적이 있었다. 화창한 낮이어서 앉아서 커피 마시고 노닥거리는 일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었는데, 달라진 것은 소리였다. 크지 않은 마을 전체가 정전이 되자,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아니 그보다는 갑자기 찾아온 정적이 더 인상적이었다고 할까. 아무튼 전기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사라지자 주위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고, 하늘과 바다가, 바람과 숲이, 새와 고양이가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때 그 소리들은 마치 새로운 힘처럼 느껴졌고, 새로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자, 그 공간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해버렸다. 익숙한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면서 말이다. 물론 전기는 곧 다시 들어왔고, 다시 동네는 예전으로 돌아갔지만, 그 느낌은 아직 남아 있다. 그것은 새로운 리듬이었을까? 어쨌든 익숙했던 그곳에 알지 못했던 다른 지평의 무언가가 있었던 건 분명하다.
우리가 도시를 들어야 하는 건, 그것의 리듬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그건 우리가 가시성의 체계에 함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리듬이 분명히 어딘가에서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건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되어야 하는 문제, 즉 발명의 문제이다. 그때 우리는 리듬분석이라는 르페브르의 개념을 새로운 리듬의 구성으로 다르게 들어야 하는 건 아닐까?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