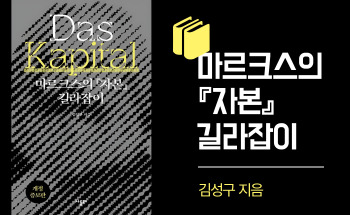현재 미국 대학 캠퍼스에 있는 국제 학생들은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언제든 납치되어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구금센터로 보내질 수 있으며, 그곳에 무기한 구금되다가 해외로 추방될 수 있다. 이 모든 일은 학생들이 어떤 알려진 법을 위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벌어진다. 정확한 통계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약 1,500명의 학생들이 학생 비자가 취소되어 추방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Unsplash, ev
출처 : Unsplash, ev
행정부는 대부분의 경우 이들 학생들이 '반유대주의'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반유대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오직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행정부조차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터프츠대학교의 한 학생은 대학 신문 <터프츠 데일리>(Tufts Daily)에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기고문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었다. 또 다른 학생은 10년 전 하마스 고문직을 떠난, 그리고 2023년 10월 하마스의 행동을 비판하기도 했던 사람과 친척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되었다. 심지어 소셜미디어 게시물조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 행정부 관료들은 학생들의 SNS 게시물을 샅샅이 뒤지며 누가 납치되고 추방될지 결정하고 있으며, 공포에 질린 학생들은 문제가 될까 두려워 자신의 게시물들을 삭제하는 데 급급하다.
'반유대주의'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학생들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는 논리는 이렇다. 즉, 학생들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 목표 중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에 맞서는 것이며, 따라서 외국인 학생은 미국 외교정책에 비판적인 발언이나 SNS 게시물을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논리다.
잠시 다음 사실들을 모두 잊어버리자.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수백만 팔레스타인인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빼앗은 무자비한 식민 정착의 결과라는 점, 이스라엘이 현재 가자지구에서 벌이고 있는 명백한 집단학살이 인류의 양심을 모욕하고 있다는 점, 수많은 유대계 학생들이 이 집단학살에 반대하는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이스라엘 국민 대다수조차 네타냐후 정부의 가자지구 작전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반시온주의가 반유대주의와 같지 않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잊자. 핵심은, 미국 행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어떤 구실로든 추방할 권리를 스스로 부여했다는 것이다. 현재는 '반유대주의'라는 구실을 대고 있지만, 이 같은 행정부의 행동은 사고하고 민감한 국제 학생 누구라도 그들의 견해와 행동이 행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격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만약 외국인 학생들과 대학의 외국인 교수들, 심지어 영주권자들에게까지 이런 공격이 가해질 수 있다면, 미국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조항)가 존재하더라도 이 공격이 미국 시민에게까지 확대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애초에 영주권자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불확실하다. 만약 이들을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미국 시민조차 '반미적 요소를 지원하거나 동조했다'는 이유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오늘날 미국 대학 캠퍼스의 상황을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과 비교해 보자. 당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대학에서는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고, 이 모든 운동에서 국제 학생들은 현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외국인 학생들이 특별한 위협에 직면하거나 공포에 질려 순응하도록 강요당하는 일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극명한 대비를 낳은 변화는 무엇일까?
본질적인 차이는 시대적 맥락에 있다. 당시 제국주의는 지금만큼이나 무자비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약화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스스로를 공고히 한 상태였다. 비록 베트남에서 패배를 맛보고 있었지만, 소련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마르쿠제(Herbert Marcuse)나 폴 바라노(Paul Baran), 폴 스위지(Paul Sweezy)와 같은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와 경제학자들이 묘사했던 것처럼, 제국주의는 내부 모순을 교묘히 관리하는 데 성공한 듯 보였다. 그들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았는지는 별개 문제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상황이 그런 서술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반면 오늘날 미국 제국주의, 더 나아가 세계 제국주의 전체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이 위기의 징후 중 하나가 바로 모든 반대, 특히 캠퍼스에서 비롯되는 지적 반대를 뿌리 뽑으려는 필사적인 시도다. 트럼프 행정부 스스로 인정했듯, 미국 대학 캠퍼스는 제거해야 할 자유주의자들과 좌파 인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행정부가 대학 내 항의 시위에 대해 노골적인 공격을 가하는 이유는 바로 체제가 직면한 위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분석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신, 오늘날과 1960~70년대 초반의 차이는 트럼프처럼 신파시스트 사고를 가진 인물이 대통령직을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바로 위기의 표현이다. 옛 파시즘이 그러했듯, 신파시즘도 위기 상황에서 지배계급이 자신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신파시스트 세력과 동맹을 맺을 때 등장한다. 그러므로 트럼프의 부상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나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등과 마찬가지로, 원인이 아니라 현상이다. 이를 설명하려면 현재 자본주의가 직면한 전례 없는 위기를 들여다봐야 한다.
이 위기의 특징은 체제 내에서 위기를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가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데 있다. 트럼프의 행동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위기 부정론자들은 트럼프의 행동만 보고 이를 위기를 악화시키거나 위기를 새로 만든 원인이라고 여기면서 트럼프를 "미친 사람"이라고 규정하지만, 그 '미친 행동' 이면에는 극복할 수 없는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해외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려 했지만, 이는 전방위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해 오히려 미국 내 경기 침체를 불러왔고, 결국 그 스스로 관세 부과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또, 탈달러화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들을 위협하며 달러를 방어하려 했지만, 오히려 달러의 장기적 지위를 약화했고, 달러를 통용하지 않는 지역 무역 체제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정부가 승인하는 내용만 배우고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도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하려는 시도 역시 미국 교육 체계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미국에는 약 110만 명의 국제 학생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이며, 이 등록금 수입이 미국 고등교육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러 대학이 이미 연방 정부의 지원 삭감에 직면해 있고(콜롬비아대나 하버드대처럼 '반유대주의'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맞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국제 학생 수입까지 줄어들면 상당수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존립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국제 학생의 부재와 그로 인한 획일화는 미국 대학의 지적 생태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런 상황은 세계 남반구 국가들에게 미국으로의 두뇌 유출을 끝내고 자국 교육 시스템을 재편하여 인재를 국내에 머물게 할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모디 정부에게 이런 기대를 걸 수는 없다. 하지만 모디에 대한 민주적 대안 세력이라면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 나치가 독일에서 집권했을 때, 라빈드라나트 타고르(Rabindranath Tagore)는 독일 특히 유대인 학자들의 대규모 탈출을 예상하고 그들을 비스바바라티(Vishwa Bharati, 인도 국민시인 타고르가 세운 대학으로 "세계와 인도의 만남"을 꿈꾼 특별한 국립대학)로 끌어들이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오늘날 우리 민주 진영도 이처럼, 자본주의 위기가 제공하는 기회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출처] Terror on the Campus
[번역] 이꽃맘
- 덧붙이는 말
-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은 인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자 정치 평론가다. 그는 1974년부터 2010년 은퇴할 때까지 뉴델리의 자와할랄 네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 연구 및 계획 센터에 몸담았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